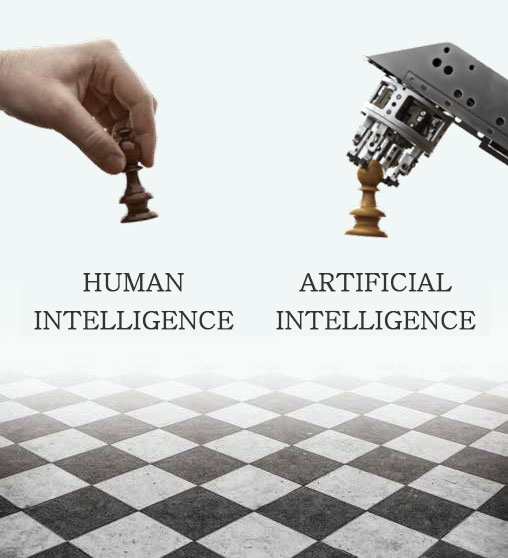목차

-
 gallery
세상을 바꾸는 ‘다른 시선’의 힘!
1 page
gallery
세상을 바꾸는 ‘다른 시선’의 힘!
1 page
-
 opinion
인간 vs 인공지능? 더불어 사는 미래가 시작
2 page
opinion
인간 vs 인공지능? 더불어 사는 미래가 시작
2 page
-
 insight
세상을 바꾼 퍼스트 무버, 관습과 차별을 깬
3 page
insight
세상을 바꾼 퍼스트 무버, 관습과 차별을 깬
3 p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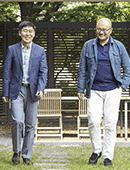 people
다른 시선으로 도시 건축의 다른 미래를 제시하
4 page
people
다른 시선으로 도시 건축의 다른 미래를 제시하
4 page
-
 curator’s choice
영화 속 인공지능, 현실에서는?
5 page
curator’s choice
영화 속 인공지능, 현실에서는?
5 page
-
 road trip
자연을 벗 삼은 풍요로운 땅을 달리다
6 page
road trip
자연을 벗 삼은 풍요로운 땅을 달리다
6 page
-
 trip gourmet
청아한 맑은 향으로 즐기는 영양 만점 여름 보
7 page
trip gourmet
청아한 맑은 향으로 즐기는 영양 만점 여름 보
7 page
-
 motor story
한여름날의 SUV 오토캠핑!
8 page
motor story
한여름날의 SUV 오토캠핑!
8 page
-
 favorite things
금기숙 교수의 여가식미
9 page
favorite things
금기숙 교수의 여가식미
9 page
-
 scene of object
영국 신사의 품격을 말하다, 킹스맨 우산
10 page
scene of object
영국 신사의 품격을 말하다, 킹스맨 우산
10 page
-
 aju spirit
아주인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휴가’의 정석
11 page
aju spirit
아주인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휴가’의 정석
11 p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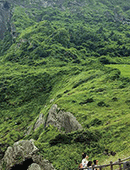 aju sharing
휴식과 위안의 제15회 아주 특별한 여행
12 page
aju sharing
휴식과 위안의 제15회 아주 특별한 여행
12 page
-
 aju sharing
아이들의 생각이 커가는 꿈꾸는 작은 책방
13 page
aju sharing
아이들의 생각이 커가는 꿈꾸는 작은 책방
13 page
-
 reader’s view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14 page
reader’s view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14 page
-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15 page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15 page
opinion
인간vs인공지능?
더불어 사는 미래가 시작되다!
글. 최호섭
사람과의 대국을 통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낸 알파고는 그 어떤 기업이나 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다.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경쟁과 공생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공지능.
계절이 한 차례 바뀌는 사이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고 있을까?
계절이 한 차례 바뀌는 사이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고 있을까?
글쓴이 최호섭은 IT 칼럼니스트로, 다수의 IT 관련 강연, 기고를 통해 사회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기술 이야기를 쉬우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