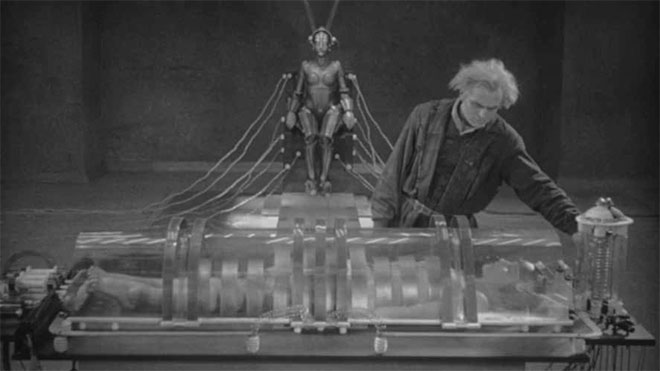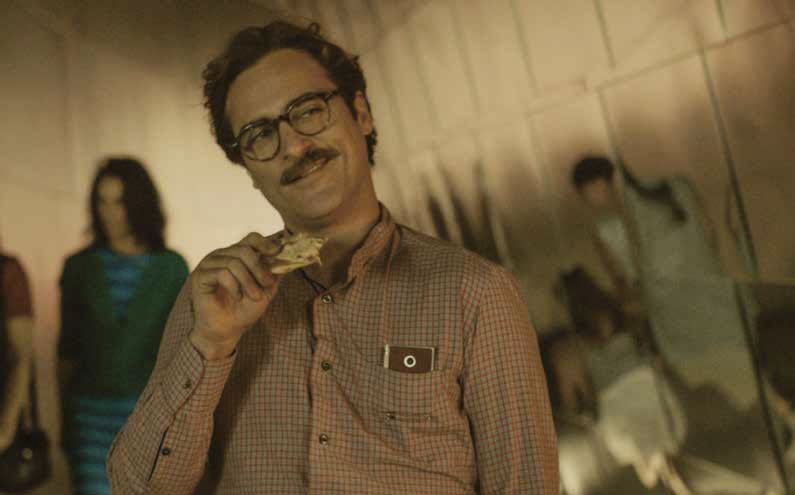목차

-
 gallery
세상을 바꾸는 ‘다른 시선’의 힘!
1 page
gallery
세상을 바꾸는 ‘다른 시선’의 힘!
1 page
-
 opinion
인간 vs 인공지능? 더불어 사는 미래가 시작
2 page
opinion
인간 vs 인공지능? 더불어 사는 미래가 시작
2 page
-
 insight
세상을 바꾼 퍼스트 무버, 관습과 차별을 깬
3 page
insight
세상을 바꾼 퍼스트 무버, 관습과 차별을 깬
3 p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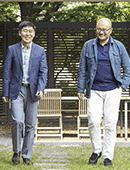 people
다른 시선으로 도시 건축의 다른 미래를 제시하
4 page
people
다른 시선으로 도시 건축의 다른 미래를 제시하
4 page
-
 curator’s choice
영화 속 인공지능, 현실에서는?
5 page
curator’s choice
영화 속 인공지능, 현실에서는?
5 page
-
 road trip
자연을 벗 삼은 풍요로운 땅을 달리다
6 page
road trip
자연을 벗 삼은 풍요로운 땅을 달리다
6 page
-
 trip gourmet
청아한 맑은 향으로 즐기는 영양 만점 여름 보
7 page
trip gourmet
청아한 맑은 향으로 즐기는 영양 만점 여름 보
7 page
-
 motor story
한여름날의 SUV 오토캠핑!
8 page
motor story
한여름날의 SUV 오토캠핑!
8 page
-
 favorite things
금기숙 교수의 여가식미
9 page
favorite things
금기숙 교수의 여가식미
9 page
-
 scene of object
영국 신사의 품격을 말하다, 킹스맨 우산
10 page
scene of object
영국 신사의 품격을 말하다, 킹스맨 우산
10 page
-
 aju spirit
아주인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휴가’의 정석
11 page
aju spirit
아주인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휴가’의 정석
11 p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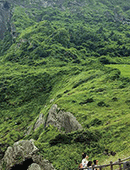 aju sharing
휴식과 위안의 제15회 아주 특별한 여행
12 page
aju sharing
휴식과 위안의 제15회 아주 특별한 여행
12 page
-
 aju sharing
아이들의 생각이 커가는 꿈꾸는 작은 책방
13 page
aju sharing
아이들의 생각이 커가는 꿈꾸는 작은 책방
13 page
-
 reader’s view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14 page
reader’s view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14 page
-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15 page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15 page
curator’s choice
〈메트로폴리스METROPOLIS›1927부터 〈그녀HER›2013까지, 영화 백년사 속 인공지능의 진화
영화 속 인공지능, 현실에서는?
글 . 김도훈 사진 제공. 파라마운트 픽처스, 워너 브라더스
알파고의 기념비적인 승리를 보며 당신은 인간이 결국
인공지능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거라는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 더 불안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리우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스크린을 통해 전해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리우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스크린을 통해 전해 왔다.
깊은 사유를 품다
글쓴이 김도훈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편집 장이자 영화 칼럼니스트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 영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해석과 시선이 담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