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15 NEW YEAR
메인페이지
2015 NEW YEAR
메인페이지
-
 PROLOGUE
마음을 합쳐 우리의 빛깔을 만들다
1 page
PROLOGUE
마음을 합쳐 우리의 빛깔을 만들다
1 page
-
 ABOUT COVER
평화로운 동화의 세계로 안내하다
2 page
ABOUT COVER
평화로운 동화의 세계로 안내하다
2 page
-
 ESSAY ON LIGHT
빛나거나 혹은 반짝이거나
3 page
ESSAY ON LIGHT
빛나거나 혹은 반짝이거나
3 page
-
 SCENE OF LIGHT
예술가의 빛이 된 뮤즈
4 page
SCENE OF LIGHT
예술가의 빛이 된 뮤즈
4 page
-
 PICTORIALISM OF LIGHT
카메라, 빛과 어둠의 찰나를 포착하다
5 page
PICTORIALISM OF LIGHT
카메라, 빛과 어둠의 찰나를 포착하다
5 page
-
 FUN OF LIGHT
당신의 불꽃은 무엇인가
6 page
FUN OF LIGHT
당신의 불꽃은 무엇인가
6 page
-
 JOY OF LIFE
삼대가 모여 사는 즐거움
7 page
JOY OF LIFE
삼대가 모여 사는 즐거움
7 page
-
 TASTE OF HUMANITIES
러시아 문학의 거봉,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8 page
TASTE OF HUMANITIES
러시아 문학의 거봉,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8 page
-
 DIGITAL CREATIVE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가져라! 김승덕(르
9 page
DIGITAL CREATIVE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가져라! 김승덕(르
9 page
-
 EXCITING DISCOVERY
도전! 함께 뛰는 뜨거운 심장
10 page
EXCITING DISCOVERY
도전! 함께 뛰는 뜨거운 심장
10 page
-
 AJU SPECIAL HEART
나눔이 있으면 행복도 두 배! 제10회 사랑의
11 page
AJU SPECIAL HEART
나눔이 있으면 행복도 두 배! 제10회 사랑의
11 page
-
 AJU SWEET MOMENT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겨울 특선 굴 요리
12 page
AJU SWEET MOMENT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겨울 특선 굴 요리
12 page
-
 AJU SPECIAL
영원한 청년 청남 문태식, 영면에 이르다
13 page
AJU SPECIAL
영원한 청년 청남 문태식, 영면에 이르다
13 page
-
 AJU NEWS
아주의 소식
14 page
AJU NEWS
아주의 소식
14 p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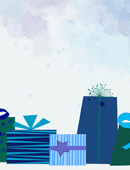 READER’S VOICE
독자들의 목소리와 아주의 선물
15 page
READER’S VOICE
독자들의 목소리와 아주의 선물
15 page
-
 HAVE A VERY NICE DAY
새해 인사
16 page
HAVE A VERY NICE DAY
새해 인사
16 page
JOY OF LIFE
삶의 옷, 집의 즐거움
삼대가 모여 사는 즐거움
글. 이용한(시인) 사진. 안홍범
우리 삶의 옷이라 할 수 있는 집의 풍경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여럿 사람이 그것도 삼대가 한공간에서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교감’하는 삶을 가꾸어 가는 그들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본다.
글 이용한
이용한은 시인이자 작가로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쓴다. 『안녕 고양이』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영화 「고양이 춤」 제작과 시나리오에도 참여했으며, 『바람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사라져 가는 오지 마을을 찾아서』 등을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