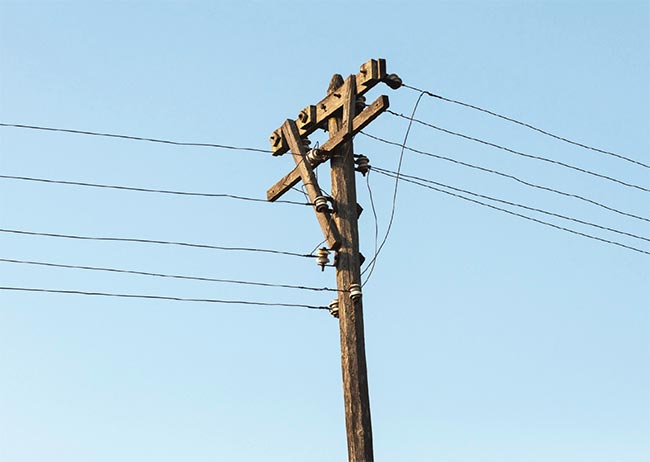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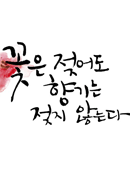 PROLOGUE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1 page
PROLOGUE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1 page
-
 ABOUT COVER
허상과 실재의 경계에서 다시 태어난 환상
2 page
ABOUT COVER
허상과 실재의 경계에서 다시 태어난 환상
2 page
-
 ESSAY ON FRAGRANCE
짙은 묵향으로 인품을 그리다
3 page
ESSAY ON FRAGRANCE
짙은 묵향으로 인품을 그리다
3 page
-
 SCENE OF FRAGRANCE
향기, 낯선 세상을 부화시키다
4 page
SCENE OF FRAGRANCE
향기, 낯선 세상을 부화시키다
4 p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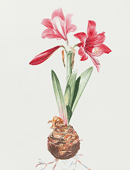 PICTORIALISM OF FRAGRANCE
종이 위에 피어오른 한 줌의 향기
5 page
PICTORIALISM OF FRAGRANCE
종이 위에 피어오른 한 줌의 향기
5 page
-
 FUN OF FRAGRANCE
삶의 부피를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당신의 취향
6 page
FUN OF FRAGRANCE
삶의 부피를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당신의 취향
6 page
-
 JOY OF LIFE
행복이 배가 되는 창평 양진제
7 page
JOY OF LIFE
행복이 배가 되는 창평 양진제
7 page
-
 TASTE OF HUMANITIES
예술가들의 고향, 통영 조금 더 따뜻하고 깊게
8 page
TASTE OF HUMANITIES
예술가들의 고향, 통영 조금 더 따뜻하고 깊게
8 page
-
 DIGITAL CREATIVE
모든 이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예술
9 page
DIGITAL CREATIVE
모든 이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예술
9 page
-
 EXCITING DISCOVERY
봄 꽃길 사이로 퍼지는 가족의 행복
10 page
EXCITING DISCOVERY
봄 꽃길 사이로 퍼지는 가족의 행복
10 page
-
 AJU SPECIAL HEART
아주복지재단의 십년
11 page
AJU SPECIAL HEART
아주복지재단의 십년
11 page
-
 AJU SWEET MOMENT
하얏트 리젠시 제주를 가꾸는 사람들의 아주 특
12 page
AJU SWEET MOMENT
하얏트 리젠시 제주를 가꾸는 사람들의 아주 특
12 page
-
 AJU SWEET MOMENT
아주캐피탈과 함께 생활이 윤택해지는 나눔
13 page
AJU SWEET MOMENT
아주캐피탈과 함께 생활이 윤택해지는 나눔
13 page
-
 AJU HOPEFUL DAY
콘크리트 전봇대가 한국에 등장한 까닭은?
14 page
AJU HOPEFUL DAY
콘크리트 전봇대가 한국에 등장한 까닭은?
14 p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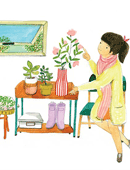 AJU HAPPY STORY
방 안의 봄꽃들이 전해준 희망의 미소
15 page
AJU HAPPY STORY
방 안의 봄꽃들이 전해준 희망의 미소
15 page
-
 AJU NEWS
아주의 소식
16 page
AJU NEWS
아주의 소식
16 page
-
 REDER’S VOICE
독자들의 목소리와 아주의 선물
17 page
REDER’S VOICE
독자들의 목소리와 아주의 선물
17 page
-
 HAVE A VERY NICE DAY
그대 앞에 봄이 있다
18 page
HAVE A VERY NICE DAY
그대 앞에 봄이 있다
18 page
AJU HOPEFUL DAY
아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콘크리트 전봇대가 한국에 등장한 까닭은?
글. 조시영(매일경제신문 기자)
미국과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네모난 형태의 전봇대를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전봇대와 나무 전봇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전봇대와 나무 전봇대의 차이는 무엇일까?